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10월이 찾아 왔습니다. 9월 이벤트, ‘가슴을 뛰게 만든 그 단어, 그 문장, 그 책’이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성원 분들이 보내 주신 책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고스란히 전달 받을 수 있어 제게도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성원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 볼까요?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만 담아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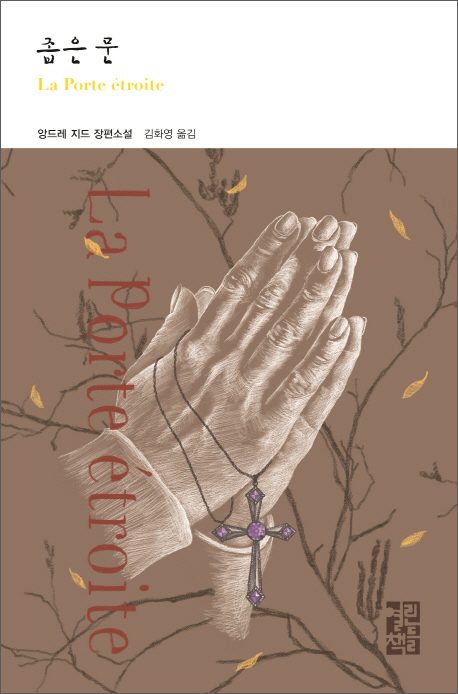
좁은 문, 앙드레 지드, 김화영 옮김, 열린책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학창 시절에 선물 받은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준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독서하기를 즐겨 완독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주인공 알리사가 느꼈을 고독함과 마지막에서의 감정, 혼자인 걸 알 바엔 차라리 죽고 싶다던 그 일기장 속 구절이 제 마음을 쥐고 흔듭니다. 또 《좁은 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문장이, 내용이 다가오는 게 늘어나 질리지도 않더군요. 비록 책은 낡고 바랬지만, 소중히 책장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었습니다
– 김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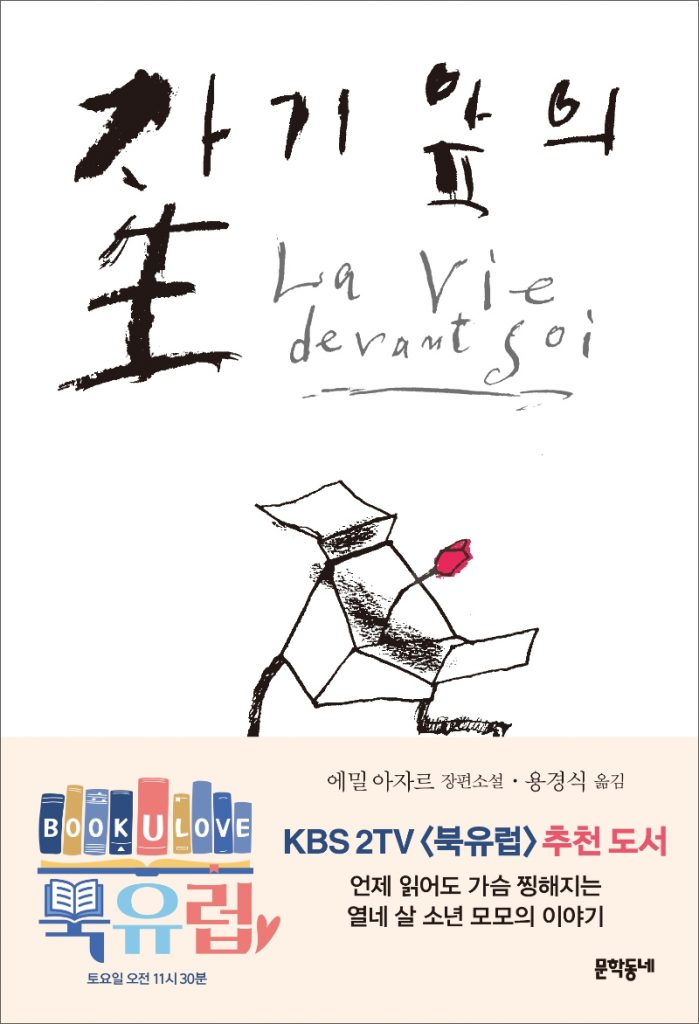
자기 앞의 생, 에밀 아지르, 용경식 옮김, 문학동네
그녀는 이제 숨을 쉬지 않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숨을 쉬지 않아도 사랑했으니까.
뜨거운 여름, 대단한 소설이라는 명성에 한번 읽어볼까 했던 작품이었던 《자기 앞의 생》이라는 대단한 소설을 읽게 되었다. ‘모모’라는 이름을 가진 아랍의 피가 흐르는 프랑스 소년과 자신을 키워준 ‘로자 아줌마’를 중심으로 어린 소년이 겪어내는 삶의 이야기. 책을 읽으며 처참한 일상을 가진 그 당시의 풍경이 머리 속에 그려졌다.
생과 삶이라는 단어에, 마지막에는 슬픔과 눈물이 뒤범벅 될 거라는 생각에, 가장 아름다운 여름 휴가에 이 책의 엔딩을 읽기로 했다. 나 자신이 행복할 때 모모와 로자 아줌마의 슬픈 이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수 같아서였다. 한 여름에 만난 뜨거운 인간애(愛),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뜨거운 존중과 애정, 참고 견디는 것, 사랑의 면모를 벅차오르게 느꼈다. 특히 소설의 마지막 장은 안구건조증에 시달리던 나에게 눈물의 맛과 펑펑 울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당분간은 모모와 로자 아줌마가 떠오르기만 해도 울컥하는 마음을 굳이 모른 척 하지 않으려고 한다. 눈물이 나오는 대로, 그대로 둘 것이다.
– 우주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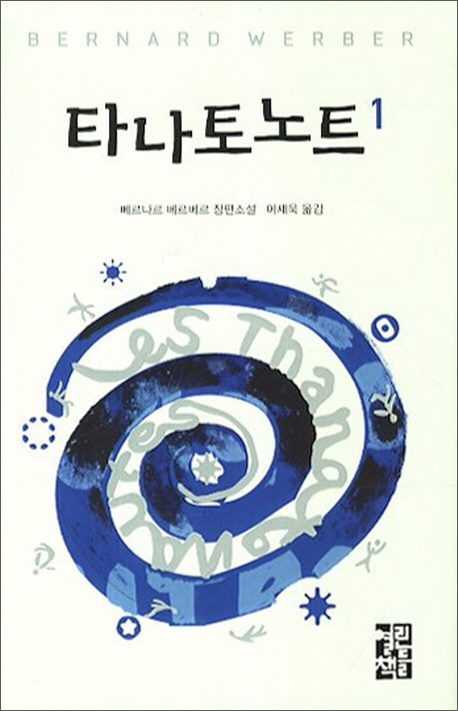
타나토노트,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세욱 옮김, 열린책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잠깐처럼 보이지만,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로 남게 된다
미셸, 책 좀 더 읽는 게 좋겠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하나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책을 읽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야. 첫번째 부류에 속하는 게 아마 훨씬 좋을걸. 지금 그 말도 어떤 책을 읽고 하는 얘기지? 나는 그렇게 반박했고 우리는 함께 웃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상투적이지만 쉽지 않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든 반드시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인생을 바꾸어주신 선생님이 있었고,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독서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고, 오락실에 가면 동네 형들에게 맞아가면서 게임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집에 있을 때 독서는 놀이였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가 생겼고, 단색의 화면이지만 무선 전화기도 생겼습니다. 책을 읽는 일보다는 친구들과 전화와 문자를 하고, 386 컴퓨터 속 삼국지의 영웅들과 대륙을 정복하는 일이 더 즐거웠지요. 때문에 중학생이 되고 난 후에는 책과의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회 선생님은 임신 중이셨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무렵 이미 배가 부르기 시작하셨고, 1학기를 마치고 출산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사회 선생님은 얘기를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셨기도 하지만, 임신 중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한창 병마에 시달리던 우리 중2 학생들도 선생님 앞에서는 얌전히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번은 사회 선생님께서 자기가 요즘 태교로 읽고 계시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태교’하면 보통 예쁘고 감성적인 이야기만 읽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이야기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여행을 떠나고(그것도 과학적으로요!),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철학적인 내용도 담겨 있는 SF 장편소설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인생의 친구를 처음 만나는 과정, 이후 다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일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날 정도였습니다. 책은 읽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워낙 재미있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이야기에 깊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려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는 이야기를 중단하셨습니다. 마치 ‘영화가 좋다’라든지,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부러 자르는 식으로 말이죠. 원망스러울 정도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은 책 제목을 소개해주시며, 만일 궁금하면 뒤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어머니와 광화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아는 대형 서점이라고는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한 곳 뿐이었기 때문에, 웬일로 어머니를 졸라 교보문고에 가서 그 두꺼운 책을 상·하 두 권이나 사서, 그날 그리고 다음날에 걸쳐 모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서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서 표지도 거의 찢어질 것 같고 많이 더러워졌지만, 지금도 그 책 덕분에 저는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책을 소개해줄 때 가장 재미있는 부분에서 멈춥니다. 가끔은 그 때만큼 두근거리는 독서를 다시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 제목은 《타나토노트》 입니다.
– 현슨

















